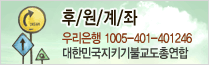스폰서 스캔들을 빚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 관련 고소 사건은 당초 경찰이 수사했다. 이때 경찰이 두 차례 김씨의 계좌를 추적해 김 부장검사와의 연결 고리를 밝히겠다며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가 김씨는 지난 4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당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마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했다. 그런데 수사에서 김씨 측 회삿돈이 김 부장검사에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은 돈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5월 4일과 14일 두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첫 번째 영장은 보강 수사하라면서 기각했고, 두 번째 영장은 '김씨에 대한 별건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병합해 직접 수사하겠다'며 역시 영장을 기각하고 사건을 도로 회수해갔다.
그다음에라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김 부장검사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사업가 김씨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은 금방 확인됐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선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김씨가 지난 5일 체포 직전 언론에 김 부장검사 연루 사실을 폭로하자 그때에야 전면적인 감찰에 나섰다.
사건 주임검사인 서부지검 박모 검사가 지난 6월 사건에 연루된 김 부장검사와 만나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도 그냥 넘기기 어렵다. 박 검사는 김 부장검사 비위 의혹을 5월 18일 대검에 첩보 보고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김 부장검사와 사적(私的)으로 만났다는 것이다. 구속된 사업가 김씨는 언론에 "김 부장검사 외의 다른 검사들과도 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전후 사정을 볼 때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했다는 의심이 든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돌려받은 시점은 진경
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스캔들이 한창 불거지던 와중이었다. 그래서 검찰이 김 부장검사 비위는 묻어두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니 검사와 법관,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검사 비리에 대해선 검찰이 경찰에 대해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