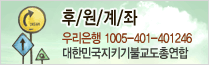현재의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석을 합치면 300석 중 165석이나 된다. 국민이 4·13 총선에서 이런 정치지형을 만들어준 것은, 아무리 해도 시정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不通)과 국정 혼란을 국회에서 거야(巨野)의 힘으로 견제·시정하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야 3당은 9일 대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요청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절하고, 12일의 시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권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장외(場外)를 선택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는 물론 헌법 정신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최근 야당의 움직임은 수권(受權)을 노리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 별도 특검을 요구했고, 대통령과 여당이 수용하자 다시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는 등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 언급에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2선 후퇴 선언이나 같다. 야당 주장대로 ‘모든 국정의 포기와 포괄적 위임’을 공식화하라는 것은 위헌을 공식화하라는 것과 같다. 박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뜻을 시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위헌과 하야를 무작정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정 혼란을 가중·연장시키게 된다.
최근의 국정 위기는 박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고, 모든 책임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도 당연하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내용만으로도, 현재의 여권이 지난 2004년 국회에서 노무현 탄핵안을 가결했던 근거에 비하면, 탄핵을 발의·추진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렇다고 해서 장외투쟁이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축을 이루는 주요 정당이라면, 시위 요인을 국회로 수렴하는 것이 기본적 책무다. 길거리 분노에 편승하거나 선동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임기를 중단시킬 ‘유일한 헌법 절차’인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