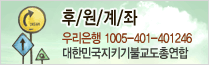이제는 안다. 그 대선에서 DJ보다는 YS가 당선된 것이 역사의 순리(順理)였음을. YS는 임기 말 외환위기 탓에 낙인이 찍혔지만, 대한민국을 군부 쿠데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이 땅에 민주주의의 초석을 깔았다. 김영삼 대통령이 없었다면 김대중 대통령도 없었고,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길지 않은 우리의 대통령사(史)에서 누구누구만 없었다면 나라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 일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수준은 민도(民度)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자조(自嘲)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식이 단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조금씩 발전해 왔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로마의 ‘기록 말살형’처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대통령이 된 듯하다. 하지만 그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산업화 시대의 명암(明暗) 가운데 어두운 유산을 털고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終焉)을 고했다는 점에서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나는 본다.
어떤 대통령의 시대건 좋든 싫든 그 자체로 역사다. 이 당연한 진리를 권력자들만 모르는 것일까. 새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전임 또는 과거 정권을 부정하고, 심지어 역사에서 지우려는 시도까지 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실패하게 돼 있다. 역사는 지우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계의 판을 바꾸고 국정 교과서까지 만들어 역사관을 ‘정리’하려 했지만 결과는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주자 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며 “대통령이 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수단”이란 말을 자주 했다. 노무현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 바로 그 세력이 득세했다는 보수정권 9년을 부정하는 의식의 발로다. 더 멀리는 자신이 표현한 대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 뒤집힌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그는 1월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친일과 독재, 사이비 보수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혁명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다. 임기 말에는 장황한 ‘역사 강의’를 즐겼다. “세종은 성군이었지만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며 “조선 500년을 지배한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은 정도전이었다”는 말도 했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사람 모두에게 정치를 하는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문 대통령이 대담집에서 말한 ‘혁명의 완성’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세상을 바꾸려다가 실패했다. 누구보다 노무현의 실패를 가까이서 지켜본 문 대통령은 훨씬 더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이를 해 나가려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 5년의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더 낫게 바뀌는 것이다.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이다. 무엇보다 적폐청산이든 뭐든 인위적으로 과거를 헤집어 뒤집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정치사의 교훈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은 ‘하고 싶은 일’과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의 균형과 경중(輕重)을 따져보고, 어떻게 하면 그 시간 안에 국익과 국민행복을 최대로 키울지부터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
박제균 논설실장 phark@donga.com
원문보기: 동아사설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821/85904853/1#csidx4d166d57a110fc789847c0862b9db2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