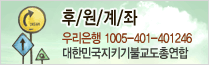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서
한 글자씩을 딴 이른바 ‘개·망·신’ 법(法)의 규제 강도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비해 너무 강해 정보 활용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 진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근거로 반대하고, 심지어 이 분야 규제 완화가 ‘대기업 특혜’라는 논리까지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했던 빅데이터 진흥법이 정권 차원의 대기업 혜택이라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까지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수많은 정보가 모인 빅데이터는 금융과 의료, 유통, 농업 등 전방위 분야에서
신산업의 원재료(原材料)로 활용된다.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석유’로 불리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해 비식별 정보로 만들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데이터 브로커’ 사업까지 성장일로에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020년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이 2100억 달러, 우리 돈 약 235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족쇄에 묶여 있는 한 우리로서는 군침만 흘리면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물론 개인정보의 활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보호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유출된 사례가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민감한 문제로 다가온다.
그러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의 활용까지 법으로 묶어놓는 것은 과잉 규제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은 익명화된 정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치열한 4차 산업혁명 경주에서 같은 출발선에 서지는 못할망정 다리에 규제 모래주머니까지 차고 달려야 하는 우리 기업의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