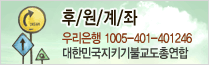‘설’ 수상
‘설’
-설에도 긴 설움이 있었다-

올해 2월 5일은 ‘설’이다.
다 아는 일이지만, 설은 음력 정월 초하루를 일컫는 말로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이다.
그래서 한자로는
원일元日 원단元旦 원정元正 원조元朝 연시年始 연수年首 정조正祖 세수歲首 등이라 쓰고 있다.
설날의 ‘설’은 순 우리 말로서 ‘설다’ '낯설다‘의 ’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민족문화대백과).
즉 새해 첯 날이 낯설기 때문에 ’설‘이라는 것이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설명절은 설날 하루에 그치지 않고, 전날(섣달 그믐밤)부터 시작하여 각종 놀이와 행사로 정월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축제이기도 하다.
설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조상(4대까지)에게 차례茶禮를 지내고 성묘도 한다.
아이들은 어른 들을 찾아 뵙고 절을 올려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 이를 ’세배‘라 한다.
또 세찬歲饌 으로는 떡국을 먹는다.
우리의 설은 그 유래도 오래고 또 수난受難도 많았다.
대개 학자들은 설의 유래를 중국의 사서史書인 수서隋書와 구당서舊唐書의 기록에서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매년 정월 원단에 왕이 연회를 베풀고
여러 하객과 관원들이 모여서 서로 경하하며, 일월신日月神에게 절을 드린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설은 왕실에서도 행하는 일종의 새해 맞이 행사였다.
규모는 작겠지만 민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행해졌을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삼국유사나 고려사에도 설과 연관된 기록이 나온다.
설은 이처럼 이미 삼국시대부터 행해 오는 한민족 고유의 명절이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전통 새해 명절이 일제 강점기를 당해서는 큰 수난을 겪는다.
우리나라에서 태양력(양력)이 수용된 것은 1896년 1월 1일이다(음력으로는 1895년 11월 17일).
양력의 수용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설명절에도 크게 영향을 초래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전통문화 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맘 놓고 설을 쇠기가 어려웠다.
명절 무렵이면 저들은 떡방앗간을 폐쇄하고, 설빔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먹칠을 했다.
그리고 일본의 명절인 천장절天長節(일왕의 탄생일) 명치절明治節 기원절紀元節(일본의 개국일) 등을
국경일로 정하여 우리 국민에게 강제로 따르게 했다.
한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면 영토만 잃는 것이 아니라 문화까지도 잃게 된다.
일제는 양력 과세를 강요 했다.
이것은 광복 후에도 계속 되었다. 세계적 조류를 거스르기가 어려워서였을까.
그러다가 설이 본래의 자기 이름을 찾은 것은 1988년 음력 정월 초하루 부터다.
1896년 양력을 공인한 이래 한세기가 가까운 92년만이다.
물론 1985년에 설날이 ‘민속의 날’로 지정되어 1일간 국가 공휴일이 된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설이 아닌 민속의 날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국인이 해방후 갑자기 전통문화를 다 버리고 서양인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전통문화의 기반 위에서 김치와 된장에 쌀밥을 먺고 살면서
우리 고유의 설날을 굳이 ‘민속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요,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후 3년, ‘민속의 날’이 ‘설날’로 원 이름을 되 찾고 ‘3일간의 국가 공휴일’로 정해지면서
이제 우리 고유의 설명절은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면목도 새로 서게 되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잘 쇠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개념의 혼란을 겪어 왔던 설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보자는 뜻이다.
설은 고향과 같은 날이고 돌아가신 조상과 함께 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거기엔 우리 민족의 혼도 깃들어 있다.
글쓴이 송 재운 (2019. 2. 1일)
표지사진 출처
본문 사진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