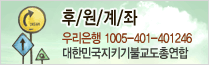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19차 중국공산당대회 개막 연설은 자신의 집권 2기,
즉 향후 5년 동안의 국정 청사진이다.
시 주석은 18일 장장 3시간24분 동안 계속된 ‘업무 보고’를 통해
21세기 중반까지 경제 및 군사 측면에서 세계 최대·최강의 슈퍼 파워가 되겠다는 ‘대국몽(大國夢)’을 공식화했다.
시 주석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2020년까지 1단계 전면적 샤오캉(小康·풍족한 생활) 실현
△2035년까지 2단계 국방과 군 현대화
△2050년까지 3단계 종합 국력과 영향력에서 세계 선도 등의 단계별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꿈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공산당 일당독재와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분간 시 주석의 중국 내 장악력이 더욱 커지고,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시 주석이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양회 노선에서 탈피해 대국굴기 노선을 공식 천명한 만큼
미·중 경쟁은 더욱 격화할 것이다.
한국은 이런 변화에 대응할 단기·중기·장기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 주석은 “어떤 경우에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드 보복에서 드러나듯 언제든 빈말이 된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이런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한·미 동맹을 축으로 중국과는 ‘좋은 이웃’으로 지내는 길을 택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대답은 자명하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적어도 시 주석이 언급한 21세기 중반까지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 이외에 대안이 없다.
우선, 한국과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서 그 체제가 다르다.
가치 동맹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국경을 맞댄 나라와의 동맹은 쉽지 않다.
한·일 관계만 봐도 알 수 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 대사는
“영토적 야심이 없는, 멀리 있는 큰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세계사의 일관된 교훈이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중국은 자유민주 체제로의 통일에 흔쾌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동맹이 없다면 낭패를 보게 된다.
시 주석의 대국몽이 강해질수록 한·미 동맹도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