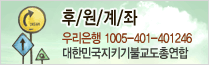이미 읽은 글, 바로 정리해서 제출했다. 하지만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쓰고, 또다시 쓰고, 그러기를 수차례, 그런 가운데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가슴에 작은 울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다. 결국 스스로 85편 전체와 그에 대한 반론들까지 모두 읽게 됐다.
놀라웠다. 현실 정치인들의 담론 수준이 이 정도였다니.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정치의 역할에 대한 철학이 있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공학이 있었다. 제10편만 해도 이런저런 ‘패거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뒤, 그 폐해를 줄이는 구도로서의 연방제를 논하고 있었다. ‘패거리 짓지 마라’ 식의 공허한 소리가 아니었다.
개헌이 논의될 때마다 그때의 글이 생각난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철학은 빈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설계 역량 또한 낮다. 힘 가진 쪽이 자기 신념이나 이익을 밀어붙이거나, 당리당략이 부딪치다 적당히 합의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개헌이었다.
그러다 보니 헌법이 헌법 같지 않다. 많은 부분에서 헌법 따로 현실 따로, 그러다 수시로 고친다고 법석이다. 현행 헌법의 국무총리만 해도 그렇다. 내각통할권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다.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었고, 또 이를 구현할 제도설계 역량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었겠는가.
제119조 제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도 좋은 예다.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경제가 이만한 나라의 경제자유도가 세계 30위를 오르내리겠나. 제2항의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 단단한 철학이 있었다면 경제민주화 노력이 이 정도에 그쳤겠는가. ‘증세 없는 복지’나 ‘부자 증세’나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또다시 이 꼴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곧 개헌안을 내겠다는 정부부터 그렇다. 철학이나 제도설계 역량 등에 있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를테면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을 말하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글쎄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 학교 내에 커피자판기 설치를 금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아니, 교육자치도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중앙정부가 법으로 정하나. 그러면서 연방제를 이야기하나.
작은 일 아니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산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산길 옆의 담배꽁초 하나도 산만큼 크게 보이는 법이다. 분권의 철학이 갖춰져 있었다면 이 문제가 보이지 않았을 리도 없고, 그냥 두었을 리도 없다. 거부권이라도 행사해 일벌백계로 삼았을 것이다.
권력 구도 문제도 그렇다. 고민이 대통령의 권력을 제어하거나 레임덕을 방지하자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그야말로 대중적 고민이거나 당리당략 차원의 고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을 운영한 ‘프로들’이 정말 고민해 왔던 문제, 즉 국가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차원의 고민을 했다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이유로 밀쳐버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국회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그래서 국회 스스로 신뢰받는 기구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이다. 의사결정의 속도만 해도 독일이나 일본 등 내각제 국가가 훨씬 더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노파심에서 한마디. 새 헌법을 ‘승리의 트로피’로 만들려 하지 마라.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억지로 담으려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잖아도 쪼개어진 세상,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슴에 비수를 품고 산다. 그 가슴을 더 아프게 하지 마라. 개헌은 통합과 조화를 위한 일이지 분열과 제압을 위한 일이 아니다.
김병준 객원논설위원·국민대 명예교수 bjkim36@daum.net
원문보기: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322/89217171/1#csidxa5e9269254175e2b4e46b1487c05f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