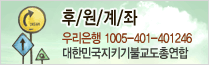이종찬(李鍾燦 동국대 명예교수)
조선조의 큰스님을 일컬음에 있어서 서산대사를 꼽는 데는 누구나 이의가 없을 것이다.
스님은 중종 15년(1520)에 나시어
선조 37년(1604)에 입적하셨으니 84세의 세수를 누렸다.
그의 행장을 문인 편양(鞭羊)이 썼지만,
그가 노수신(盧守愼)에게 보낸 <상완산노부윤서(上完山盧府尹書)>가 자신의 행적을 자찬한 셈이니 이 글이 오히려 스님의 행적을 살피기에 알맞다 하겠다.
휘는 휴정(休靜)이고 호는 청허(淸虛)이다.
서산(西山)은 묘향산에 오래 머물러 있어 갖게 된 호이다.
스님이 남긴 청허집(淸虛集)의 글들은 스님이기 이전에 시인으로 대접받아야할 유작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인으로 대접 받아도 손색이 없을 시 몇 편을 감상하기로 한다.
白雪亂纖手 백설난섬수 흰 눈이 어지러운 섬섬옥수
曲終情未終 곡종정미종 가락 끝나도 정은 아직 남아
秋江開鏡色 추강개경색 가을 강은 거울 빛으로 열리고
畵出數靑峰 화출수청봉 푸른 두어 봉우리 그려 내다.
저택을 지나다 거문고 듣다[過邸舍聞琴]라는 시이다.
스님이 우람한 저택이 있는 동리를 지나다 그 집 안에서 거문고 타는 소리를 듣고 지은 시이다.
거문고 타고 있을 여인을 상상하며 짓는 시이다.
스님의 시라고 할 수 없으리만큼 감정이 섬세하다.
거문고의 열 두 줄을 타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길 희고 흰 손끝이 흰 눈발을 날리는 것 같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이 여인의 의상도 흰 빛이리라.
이런 상상을 하노라니 어느새 한 곡조가 끝나고 거문고 소리도 멈추었다.
그러나 듣는 이의 귓가에는 곡의 여운이 계속되면서 여인의 정이 끝나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묶어 매고 있다.
이런 곡조를 어디에 비유해야 하나.
그 맑은 선율은 가을 강물의 맑음이다.
강물이 거울이 되어 맑은 소리를 비추고 있으니 음성을 색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평이한 서술로 바꾸면 거문고 소리가 가을 강물이다.
이 거울에 무엇이 비추어질까 무수한 산봉우리들이 물에 잠긴다.
푸른 봉우리 두엇을 그림으로 그려낸다.
옛날 백아(伯牙)가 거문고를 타면
친구 종자기(鍾子期)는 그 곡을 산이나 강물로 해석하여 서로의 심기를 맺었다 하여,
시공을 초월한 우정으로 일러오고 있는데,
지금 서산대사는 묘령의 아가씨의 거문고 소리를 거울 같은 강물로 느끼다가
다시 높이 솟은 푸른 산의 봉우리로 탈바꿈을 하고 있으니,
세상에 둘도 없는 음악 해설사이다. 이것이 바로 선사들의 격식 밖의 안목이다.
一別萱堂後 일별훤당후 한번 어머니 곁을 떠난 뒤로
滔滔歲月深 도도세월심 도도히 세월만 깊어졌네
老兒如父面 노아여부면 늙은 아이 아버지 얼굴 닮아
潭底忽驚心 담저홀경심 우물 밑에서 갑찌기 놀란 마음.
그림자를 보고 느낌[顧影有感]이란 시이다.
스님이 출가하고 오랜 세월 뒤에 고향을 찾았다가
옛 우물을 굽어보다 거기에 반사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 지은 시이다.
훤당이란 집안에서 여인들이 거처하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여인들이 집안의 뒤뜰에 원추리를 심어 어머니의 장수를 빈 데서 유래한 용어이다.
이런 어머니를 여의고 승려가 된 지도 오래 되었다.
단순히 오래다는 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 자취도 모를 만하다.
도도란 물이 끊임없이 흐름을 이르는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고 오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
출가 승려가 된 몸의 세월은 지나간 것뿐이지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옛 자취가 그리워 찾아간 고향집인 것 같다.
목이 말라 물을 길으려고 우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까맣게 잊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우물 밑에 있는 것이다.
자신의 그림자임이 분명하지만 아버지의 얼굴 그대로인 것이다.
내가 출가할 당시의 아버지의 연륜이 오늘 내가 고향집을 찾은 연륜과 맞먹는 시기이다.
그러기에 내 얼굴은 내가 출가할 당시의 아버지의 얼굴인 것이다.
아무리 세속의 인연을 끊고 탈속한 몸이지만 어버이의 혈연적 이끌림은 모든 인연을 초월하는 인연의 근원이다.
우물을 들여다보는 순간적 마주침의 얼굴에 부자의 이 인연 이전의 인연이 부련 듯 겹쳐진 것이다.
출가 승려의 마음속에 잔영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혈연적 천리(天理)를 솔직하게 보여준 인간미 넘치는 시이다.
승려도 천륜적 테두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미가 위에서 말한 <상완산노부윤서>의 말미에도 여실하게 들어났으니,
“사람을 대하면 입으로 시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음은 아버지에게 부끄럽고,
욕됨을 보면 낯에 노여운 기색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음은 어머니에게 부끄러움이니,
여기에 이르러 효도라는 행위가 자식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임을 알겠다.
[對人則口不能不說於是非者 慚於嚴父也 見辱則面不能不現於慍色者 愧於慈母也 到此益知孝之一行 人子之最難也]”라 하였다.
승려 이기 이전에 남의 자식임이 인간적 본성이 아닌가.
다음은 자연을 읊는 시인으로서의 스님을 만나 보자.
泥爲靑石髓 니위청석수 진흙이 푸른 돌 속의 뼈
松作老龍鱗 송작노룡린 솔은 늙은 용의 비늘
犬吠白雲隔 견폐백운격 개의 짖음 구름에 막히고
桃花洞裏人 도화동리인 복사꽃 속 동네 사람들.
화개동(花開洞)에서 지은 시이다 전편에 느끼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깊숙한 동리이다.
그러나 표현에는 깊고 아늑하다는 말이 없다. 그렇지만 유심한적한 분위기가 살아 있다.
흙에 돌이 묻혀 있어 흙이 살이요 돌이 뼈라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만,
여기서는 흙이 뼈라니 돌이 살인 셈이다.
역시 일상 논리의 역설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다.
네 주위가 모두 암벽으로 싸여 있으니 그 속의 흙이 뼈인 셈이다. 흙이 돌의 뼈가 되었다.
논리는 뒤집혀도 현상은 정상이다.
이것이 바로 선시의 반상합도(反常合道상식을 뒤집지만 진리에 들어맞음)인 비논리의 논리인 것이다.
용의 비늘 같은 소나무, 얼마나 세월을 이겨낸 소나무인가.
영겁을 지금의 찰나로 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자는 찰나에서 영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개 짖는 소리로 보아 인가가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집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흰 구름이 앞을 가린다.
개의 짖음은 분명 시끄러움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고요함 그대로이다.
역시 반상합도의 진리이다.
동중정(動中靜)이요 훤중적(喧中寂)이다.
결구는 다시 이를 뒤집는다.
복사꽃은 부동(不動)이고 저 안쪽이 있을 사람은 동(動)이다.
그래서 동중정으로 꽃과 사람이 일치되는 것이다.
꽃이 사람인가 사람이 꽃인가.
무엇이라 해도 좋다.
이 유정물과 무정물의 합일 이것이 바로 선경이다.
몇 편의 시에서 서산대사를 시인의 면모로 살펴보았다. <끝>
■ 주요 학력과 이력
● 1933년 경기도 부천 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