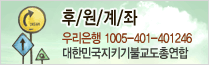| 티베트는 독립할 수 있을까? 이광일/한국일보 논설위원 티베트 시위 사태를 접하면서 20년 전 일이 떠올랐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나는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외국 언론인 취재를 맡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공산권은 금단의 땅이어서 소련이나 동독, 헝가리 같은 나라의 기자 인터뷰는 충분히 기사거리가 됐다. 그런데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백인이 리투아니아 독립을 외치는 팸플릿을 들고 한국일보 부스에 들어왔다. 호주의 한 통신사 기자인데 틈틈이 어릴 때 떠나온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50년 만에 독립한 리투아니아 아니, 리투아니아가 소련에 합병된 게 언젠데 아직도 독립운동을 한단 말인가. 히틀러와 스탈린이 리투아니아를 소련에 합병하는 조약을 맺은 것이 1940년이니까 나라가 없어진 지 50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일제 36년간 나라를 잃었던 한국인으로서 그 할아버지 기자의 호소를 듣는 기분은 참 묘했다. 저런다고 소련이라는 강대국에서 벗어나 독립이 될까 싶었지만 꼭 기사화해야겠다는 의무감 같은 것을 느꼈다. 기사는 사회 2면 머리로 나갔다. 그런데 웬걸. 1년 반 뒤인 90년 3월 리투아니아는 독립했다. 다시 1년 후에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까지, 발트 3국이 모두 독립을 되찾았다. 공산 소련의 개혁 개방이 연방 체제의 해체로 이어질 줄 그 누가 알았으랴. 티베트가 중화인민공화국에 무력으로 강점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그로부터 두 세대가 흘렀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고유한 일부라고 떠들지만 말짱 거짓말이다. 원나라의 속국이었으므로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데, 원나라는 당시 몽골제국의 일부로 현재의 몽골공화국이 승계자다. 몽골제국은 몽골족의 발원지인 몽골 고원은 물론 한족의 중원, 페르시아와 러시아 일부까지 판도에 넣고 있었다. 당시 티베트의 법왕(法王)은 몽골제국 황제의 스승으로 속국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속국이라 한들 중국이 아닌 몽골의 속국이었다. 같은 식민지 처지였던 중국이 종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다.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다. 청나라는 명나라의 법통을 잇는 중국이 아니다. 만주족이 중국,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위구르, 몽골족 상당수, 한족, 티베트 등 4대 민족을 다스린 대제국이었다. 20세기 들어 만주족 지배가 해체되면서 한족이 그 지위를 잽싸게 빼앗았을 뿐 티베트가 전통적인 의미의 중국의 일부였던 적은 없다. 우선 본인들이 아니라지 않는가. 중국은 이러한 사정을 호도하려고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다. 전 인구의 92%인 한족에다가 티베트, 위구르, 몽골, 조선족 등 55개 소수민족을 합쳐 새로운 민족을 발명해낸 것이다. 영국 출신의 백인과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남미 출신의 라틴계와 아메리카 인디언, 기타 일본ㆍ중국ㆍ한국ㆍ이탈리아계까지 다 합해서 ‘미국 민족’으로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몽골의 영웅 칭기즈칸은 중화민족의 영웅으로 둔갑한다. 그 중화민족이 큰 가족을 이루어 화목하게 산다는 것이 바로 중국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중화민족 대가정’이다. 티베트가 중국이 아닌 이유 그런데 무슨 가정이 한 번 싸움이 나면 수십 만 명씩 죽어나간다. 이유는? 원래 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땅덩어리가 크다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늘 골치가 아프다. 티베트가 독립하면 위구르를 비롯한 다른 소수 민족들의 독립 요구도 거세질 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 치안과 안보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만주족이 2배로 늘려준 땅이 다시 지금의 절반(명나라 때 영토)으로 줄어든다. 티베트는 독립할 수 있을까?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덩치와 위상을 생각하면 당연히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리투아니아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역사는 왕왕 인간 인식의 한계를 비웃는다. (200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