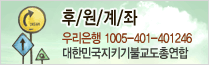| “정보 분석은 정신과 의사의 진단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수집된 사실들을 종합해 가능한 한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요. 모호하고 단편적인 사실들을 이어 그림을 완성하는 작업입니다.” 올해 1월 사석에서 만난 전직 미 행정부 정보담당 관리의 말이다. 그는 ‘100%의 확실성이란 존재할 수 없는 세계’의 고충을 회상하면서 “점(點)들을 잇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私)’가 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의 노하우와 판단력을 최대한 동원해도 정확성을 보장 못하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선입견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면 엉뚱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주관성의 물을 쥐어 짜내는 과정이 혹독할수록 ‘최종 고객’(대통령)에게 배달되는 상품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최근 워싱턴을 달구는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 파문을 보며 ‘전문가의 객관성’을 강조하던 그 관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이번 정보는 사실 평가받을 만한 노작(勞作)이었다. “운 좋게 좋은 출처 하나 잡아서 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은 물론 유럽국가 정보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도 바탕에 깔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상의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다. 의회에선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하지 않고 7개월이나 감추는 바람에 국제사회가 의혹을 검증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IAEA도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핵 협상 진전을 갈망하는 상황에서 골치 아픈 장애물이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아 쉬쉬했다’는 비판 앞에서 부시 행정부의 변명은 궁색하다.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만약 지난해 가을 미국이 IAEA에 보고했다면 잠깐은 진통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됐다는 것. 부시 행정부가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정치를 개입시키려 한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미국과학자조합(UCS)이 지난주 환경청 과학자 1600명을 조사한 결과 60%가 “지난 5년간 정치가 끼어든 압력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의 테러용의자 재판을 담당했던 전직 검사장은 지난달 28일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죄질이 나쁜 수감자들을 대선에 앞서 기소하면 전략적 의미를 지닐 것’이라며 정치적 입김을 행사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권의 어젠다에 봉사해주길 바라는 건 어느 권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념적 아집이 강한 정권일수록 특히 심해진다. 노무현 정권 5년간 외교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의 판단에 정권 이데올로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다 파문을 빚은 일이 얼마나 잦았던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김기삼 씨가 요즘 미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공작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도 ‘최고의 프로 집단을 지향하는 국정원에 사가 끼었던’ 시절의 허물이다. 서울에서 워낙 ‘실용주의’가 화두인 것 같아 책자를 뒤적이다 뉴욕시립대 루이스 메넌드 교수의 글을 발견했다. 메넌드 교수는 존 듀이, 찰스 샌더스 퍼스 등 19세기 말 미국 실용주의 철학자들이 가진 사상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현 상태를 정당화하거나 부인하기 위해 선험적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야말로 그들이 가르쳤던 본질이다.” 이기홍 워싱턴 특파원 sechepa@donga.com |